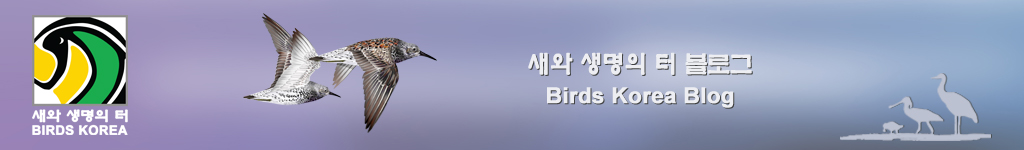백민재,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올겨울, 동해안을 찾아온 새들을 만나러 배에 올랐다. 겨울바람에 맞서며, 짙푸른 고성 바다의 파도 사이로 바다쇠오리, 알락쇠오리, 큰논병아리, 흰수염바다오리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윤슬과 새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저 멀리 보이는 새가 아비인지 아닌지 동정에 자신이 없었지만, 주위 박사님들의 설명을 듣고, 도감을 보며 흔들리는 쌍안경 속 모습을 포착하고, 특징을 찾아보길 여러 차례. 어렴풋이 각종별 특징을 가늠할 수 있었다.

사진1: 바다쇠오리(Synthliboramphus antiquus), 출렁이는 파도 사이 작은 하얀 점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 출처: Bernhard Seliger
조사 내내 무어스 박사님께서는 새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섬세하게 새에게 다가갔고, 새들은 다가오는 우리를 보며 초반에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그대로 물 위를 떠다니곤 했다. 해안에서 새를 볼 때도 무어스 박사님께서는 항상 새들의 시선을 고려하고, 새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셨다.
새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고요 속에서 새는 우리를, 우리는 새를, 서로를 충분히 관찰하고 떠나간다. 끝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 위를 유영하는 새들의 모습. 새들을 두 눈에 담을 때면 주변의 소리는 사라지고, 찰나지만 새와 자연만이 담긴 그 장면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진2: 흰부리아비(Gavia adamsii), 확연하게 큰 크기로 웅장함을 주었던, 천천히 우아하게 움직이던 흰부리아비 / 출처: 김어진
새의 입장에서 새를 관찰하는 시간을 통해, 탐조 또는 사진을 찍으며 새에게 다가갔던 나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을 짚어보게 되었다. 나는 그간 새들에게 사려깊게 행동했을까?
조사는 새로운 새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주었지만,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새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의 참담함도 있었다. 당시 마치 내가 그물에 걸린 듯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란… 별다른 방도 없이 배를 돌리면서도 그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자유롭고 아름다웠지만 수면 아래로 펼쳐진 그물 등의 각종 장애물은 새들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고, 이 사실은 새를 볼 때 마냥 즐겁기만 하던 마음을 먹먹함으로 가득 차게 했다.

사진3: 흰갈매기(Larus hyperboreus) / 출처: Bernhard Seliger
우리가 새를 마주하려는 마음이, 호기심과 즐거움을 넘어 모든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